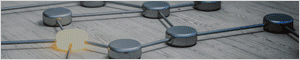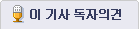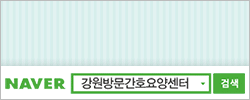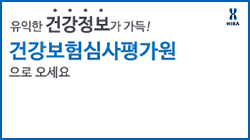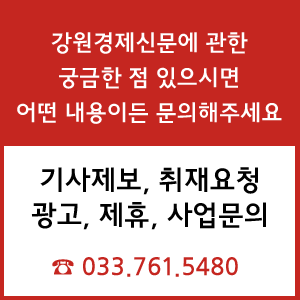첫 농사로 거둔 늙은 호박 한 덩이 쥐만 피해 잘 둔다고 광 선반 위에 올려놓고는 깜박, 해 넘긴 오늘 우연히 보게 된 그 호박 덩이 꼭지는 짜부러지고 살갗은 다 곯은 것이 병상에서 오래 앓다 가신 쭈글쭈글했던 우리 엄마 뱃가죽만 같다 아, 시리디 시린 어린 날 구들목 너끈히 덮어주던 두툼했던 나의 올새여.
*청맹과니 : 눈은 떠있어도 실제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가르키는 우리말이다. *올새 : 피륙의 근원이 되는 씨실과 날실을 통틀어 이르는 말.
먹거리가 넉넉하지 않던 시절, 우리 어머님들은 텃밭 귀퉁이나 흙담, 초가집 옆에 거름을 듬뿍 넣고는 호박모를 옮겨 심으셨다. 어린 호박은 채로 썰어서 부침개나 볶음으로 중간치는 된장국으로 그 계절의 주된 밥상의 국으로 오른다. 노랗게 익은 호박은 새끼로 엮은 받침대에 올려져 장식되며 특별 대접을 받는다. 못생긴 호박이 잘 익으면 곱게 모셔지는 공주다. 금방 먹기보다는 꼭 저장되기 마련이었다. 눈내리고 입이 궁금할 적이면 숟가락으로 박박 긁어서 죽을 쑤거나 솥뚜껑을 뒤엎어서 찌짐이를 부치면 온 집안이 고소한 냄새로 가득하게 된다. 자녀 많은 시골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에게는 끼니때가 왜 그리 빨리 오는지 늘상 밥상 차리기가 무서웠던 우리 어머니들이시다. 그 어머니의 젊은 시절의 희고 곱던 살덩이를 먹고 성장한 자식들이 되어 사람 구실을 하고 산다. 때로 혼자 큰듯이 큰소리 치며 대들지만 실은 그 어머니의 갈라지고 터진 손등이 눈에 밟혀서 되려 베짱을 부린다. 어머니가 몹시도 그리운 시인에게는 눈물의 사모곡으로 받아들여 진다. 울새를 들어 청맹과니처럼 지난 세월을 포개며 가슴아린 일면을 시로서 묘사와 표현으로 부르는 그리움의 반성을 애틋함으로 읽는다. 안진경 시인은 경희대 사이버대 문예창작 졸업으로 박경리문학 편지쓰기 전국대회 우수상, 제3회 밴드 문학상 장원을 하였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토지문학회 관련기사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