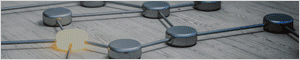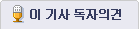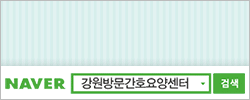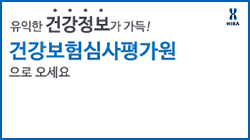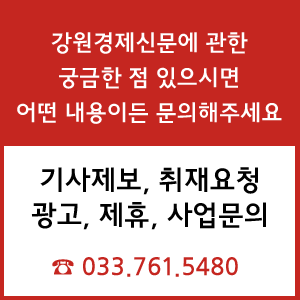|
ㄱ. 달걀부침 우리 집 아이들은 ‘계란후라이’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릅니다. 곁님과 내가 이런 말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 아이들은 어린이집을 드나들지 않고, 바깥밥집이나 이웃집에 찾아가는 일이 드물기도 해서 이런 말을 들을 일조차 없습니다. 이웃집 마실을 아이들과 할 적에 함께 밥을 먹는다면, 이웃집에서 아이들 입맛에 맞을 먹을거리가 무엇이 있을까 헤아리면서 달걀을 부쳐 주시곤 하는데, 아이들이 못 알아들으니 으레 갈팡질팡하시곤 합니다. ‘계란후라이’가 아니면 무어라 말해야 할는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침개를 하거나 지짐이를 해요. 빈대떡이건 ‘전(煎)’이건 부치거나 지집니다. 달걀을 톡 깨서 넓게 편 다음 기름으로 지글지글 익힌다면, 이렇게 지글지글 익히는 그대로 ‘달걀부침’이나 ‘달걀지짐’입니다. 딱히 우리 말글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이런 낱말을 쓰지 않아요. 꽃지짐을 하고 부추부침을 합니다. 오리알을 톡 깨서 지글지글 익힌다면, 오리알부침이나 오리알지짐이 될 테지요. 언제나 그러할 뿐입니다. ㄴ. 종이책 책은 예나 이제나 책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종이책’이라는 낱말이 생깁니다. 컴퓨터가 널리 자리잡고, 디지털파일로 글을 쓰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따로 ‘종이로 만든 책’을 사서 읽지 않고, 컴퓨터를 켜서 화면에 흐르는 글을 읽는 사람이 나온 뒤부터입니다. 이제는 ‘전자책’이나 ‘누리책’이 나옵니다. 전자책이나 누리책을 읽도록 해 주는 단말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책은 예나 이제나 똑같이 책이지만, 앞으로는 ‘종이책·누리책(전자책)’으로 나눌밖에 없구나 싶어요. 가만히 보면, 편지는 늘 손으로 쓰는 편지였지만, 일찌감치 ‘손편지(종이편지)’와 ‘누리편지(인터넷편지)’로 나뉘었어요. 신문도 ‘종이신문·누리신문(인터넷신문)’으로 나뉜 지 제법 되었습니다. 머잖아 ‘종이돈·누리돈(전자돈)’으로 나뉠 수 있겠지요. 나무한테서 얻은 종이로 꾸리던 삶이 차츰 달라집니다. ㄷ. 연꽃바위솔 겨울에 눈과 얼음 뒤집어쓴 채 씩씩하게 몽글몽글 맺힌 바위솔을 봅니다. 바위솔은 이름 그대로 바위에 뿌리를 내리며 조그맣게 피어납니다. 흙땅에 뿌리를 내리는 풀이 있고, 이렇게 바위에 뿌리를 내리는 풀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떤 넋으로 바위에 옹글종글 모여서 고운 빛을 베풀어 줄까요. 아이들은 눈더미를 찾아 이리저리 달리면서 눈을 뭉치고 노느라 바쁩니다. 나는 아이들하고 눈놀이를 하다 말고 바위솔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물끄러미 마주하는 이 바위솔은 바위솔 가운데 ‘연화바위솔’이라 하는데, ‘연화’가 무엇인지 몰라 머리로 이름을 곰곰이 외웁니다. 나중에 식물지를 찾아봅니다. ‘연화바위솔’에서 ‘연화’는 ‘연꽃’이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다가, 오늘날 적잖은 이들은 ‘연뿌리’라 안 하고 ‘연근’이라 말한다고 깨닫습니다. 연잎은 그냥 ‘연잎’이라 할까요? 연꽃처럼 생겼으니 ‘연꽃바위솔’이라는 이름이 가장 어울리면서 고우리라 생각합니다. ㄹ. 고양이 가방 설을 맞이해 두 아이를 데리고 음성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뵈러 다녀왔습니다. 선물 두 꾸러미와 아이들 옷가지와 여러 가지를 챙긴 커다란 가방을 짊어집니다. 마실길에 아이들 먹일 밥을 챙긴 천가방을 어깨에 낍니다. 큰아이는 저도 가방을 메겠다면서, “아버지, 내 고양이 가방은?” 하고 묻습니다. 큰아이 손이 안 닿는 데에 걸어 놓은 고양이 가방을 내려서 주니, 이 가방에 고양이 인형 하나와 동생 자동차 인형 하나를 넣습니다. 그러고는 씩씩하게 둘러메고 함께 걷습니다. 새빨간 빛깔에 하얀 고양이 얼굴이 큼직하게 붙은 가방을 가리켜 큰아이는 언제나 ‘고양이 가방’이라 말합니다. 버스를 타고 순천으로 가서 기차로 갈아타며 가는 길에 큰아이는 동생과 고양이 놀이를 합니다. 큰아이 가방에 붙은 고양이를 가리키는 상표이름이 있기는 하지만, 큰아이한테 굳이 상표이름을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흰얼굴 고양이이니까 그저 고양이 가방일 뿐이거든요. ㅁ. 뻐꾸기 아이들과 자전거를 타고 마실을 나가는 길입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날 즈음, 샛자전거에 앉은 큰아이가 “아버지, 뻐꾸기 눌러 봐요, 뻐꾸기.” 하고 말합니다. “응?” 하고 살짝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아하 하고 깨달으면서, 자전거 손잡이에 붙인 ‘뿡뿡’ 소리나는 나팔을 누릅니다. 딸랑딸랑 울리면 ‘딸랑이’인데, 우리 자전거에 붙인 조그마한 나팔에서 나오는 소리를 아이는 뻐꾸기 소리로 느껴 ‘뻐꾸기’라고 하는구나 싶습니다. 뿡뿡 뿡뿡 소리를 내면서 새롭게 생각해 봅니다. 일곱 살 어린이 귀에는 이 소리가 ‘뻐어꾹 뻐어꾹’처럼 들렸을까요. 곰곰이 귀를 기울이니,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빵빵’으로 들었으면 아이는 ‘빵빵이’라고 말했을는지 모르고, ‘뾰롱뾰롱’으로 들었으면 아이는 ‘뾰롱이’라고 말했을는지 몰라요. 듣는 대로, 느끼는 대로, 받아들이는 대로 새 이름이 태어납니다. 천천히 천천히 나팔을 누르면서 뻐어꾹 뻐어꾹 소리를 내어 봅니다. <저작권자 ⓒ 강원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남 고흥에서 '사진책 도서관 : 함께살기'를 꾸립니다. <10대와 통하는 우리말 바로쓰기>, <뿌리깊은 글쓰기>, <사진책과 함께 살기>, <골목빛, 골목동네에 피어난 빛>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같은 책을 썼습니다.

|